
인간은 자음과 모음으로 분절되는 다양한 말소리를 발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은 인간의 발음 기관이 특유의 구조와 운용 방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언어마다 말소리의 종류와 수는 다르지만, 말소리를 내는 데 참여하는 신체 기관과 그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같다.
말소리는 생존에 필수적인 여러 신체 기관의 협력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 입 안의 여러 기관들과 코, 후두, 기관(氣管), 허파 등이 그것들인데, 이 중 후두는 발성 작용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하다. 후두의 일차적 기능은 공기 외의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일이기 때문에 목구멍 정도의 높이에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런데 인간의 후두는 갓난아이 시기에는 목구멍과 비슷한 높이에 있다가, 자라면서 서서히 하강하여 더 아래쪽에 자리 잡는다.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영장류인 침팬지나 오랑우탄의 후두는 목구멍 정도의 높이에 있다는 점이다.
후두의 위치는 모음의 발음 및 분화와 직접 관계된다. 모음은 후두의 안쪽에 있는 목청이 떨리면서 소리 나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 종류로 분화되는 것은 후두 위쪽의 두 공간, 즉 목안과 입안을 울림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즉, 혀의 앞부분을 센입천장에 최대한 가깝게 함으로써 입안을 최소화하고 목안을 최대화하면 ‘ㅣ’가 발음되고, 혀를 바짝 낮춤으로써 입안을 최대화하고 목안을 최소화하면 ‘ㅏ’가 발음되며, 혀의 뒷부분을 여린입천장에 가깝게 함으로써 두 공간의 크기를 비슷하게 하면 ‘ㅜ’가 발음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음은 전설 모음-후설 모음, 고모음-중모음-저모음 등으로 분화된다. 한편, 입술도 모음의 분화에 관여하는데, 입술을 오므리고 폄에 따라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이 나누어진다.
자음은 대개 입술과 입 안의 여러 기관의 작용에 의해 분화된다. 이 기관들은 후두를 통과해 올라온 공기의 흐름을 특정 위치에서 방해하는 작용을 통해 자음의 다양한 소릿값을 만들어 낸다. 예를 들어, ‘ㄷ’은 혀끝을 윗잇몸 근처에 대어 공기의 흐름을 일단 막았다가 터뜨리듯 엶으로써 내는 파열음이다. 여기서 ‘혀끝-윗잇몸’은 이 자음의 조음 위치가 되고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듯 엶’은 조음 방법이 된다. ‘ㄱ’은 혀의 뒷부분을 여린입천장에 대고, ‘ㅂ’은 두 입술을 닫는다는 점에서 조음 위치는 ‘ㄷ’과 다르지만 조음 방법은 같다. 그 밖에도 짝을 이루는 아래위의 두 기관 사이를 최대한 좁히고 그 사이로 공기를 마찰시켜 내는 마찰음이 있고,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코안을 울려서 내는 비음과,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 옆으로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내는 유음도 있다.
― ‘발음기관의 구조와 작동 원리’
'독서 > 독서이론・언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음과 모음의 깊은 상관성(2008, 고3, 4월) (1) | 2018.03.26 |
|---|---|
| 실어증 환자(2008, 고3, 3월) (5) | 2018.03.25 |
| 개구도를 중심으로 한 음절의 특징(2007, 수능) (0) | 2018.03.25 |
| '훈몽자회'에 있는 자음 명칭, 자모음의 순서(2007, 고3, 10월) (0) | 2018.03.22 |
| 우리말을 이용하여 새 낱말 만들기(2007, 고3, 7월) (3) | 2018.03.20 |
| 소쉬르의 공시태 개념(2007, 6월모평) (0) | 2018.03.19 |
| 지성의 언어와 감성의 언어(2007, 고3, 4월) (1) | 2018.03.18 |
| 언어를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2007, 고3, 3월) (1) | 2018.03.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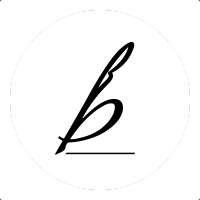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