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자기 의식을 지닌 존재이다. 자기 의식은 본질적으로 기억에 의존한다. 인간이 과거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억을 의식적으로 생각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목적을 갖고 산다는 것은 적어도 미래에 어떤 일을 성취할 것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명확한 시간적 구분을 하기 이전부터 이미 기억과 목적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도르도뉴의 라스코 동굴을 비롯한 구석기 시대의 그림들을 보면 인간은 이미 2만 년 전, 혹은 그 이전부터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하여 목적 의식을 갖고 생활했음을 알 수 있다. 동굴에다 그림을 그린 것은 일종의 마법적 목적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원시인들은 동굴의 벽이나 천장에다 동물 사냥과 같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그림으로써 시간을 고정시키고 또한 그런 사건이 미래의 다른 어떤 곳에서 또 다시 벌어지기를 기원했다. 그림을 통해서 원시인들은 과거에 벌어진 사건을 기억에 의존하여 재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양태도 자연스럽게 의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원시인들이 과거, 현재, 미래를 뚜렷하게 구분하여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끊임없는 현재에 머물면서 동물처럼 살아가려는 인간의 자연적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원시인들은 어떻게 그런 자연적 경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까? 폴 라댕은 『철학자로서의 원시인』이라는 저서에서 원시인에게는 두 가지 유형의 기질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는 행동하는 인간으로, 이들은 주로 외부의 대상에 정신을 집중하고 실용적인 결과에만 관심이 있으며 내면에서 벌어지는 ㉠동요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이다. 또 다른 유형은 생각하는 인간으로, 늘 세계를 분석하고 설명하고 싶어한 사람이다. ⓐ행동하는 인간은 ‘설명’ 그 자체에 별 관심이 없으며, 설령 설명한다고 해도 사건 사이의 기계적인 관계만을 설명하려 한다. 즉 그들은 동일 사건의 무한한 반복을 바탕에 두고 반복으로부터의 일탈을 급격한 변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반면 ⓑ생각하는 인간은 기계적인 설명을 벗어나 ‘하나’에서 ‘여럿’으로, ‘단순’에서 ‘복잡’으로, ‘원인’에서 ‘결과’로 서서히 변해간다고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외부 대상의 끊임없는 변화에 역시 당황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상을 조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상에 영원 불변의 형태를 부여해야만 했고, 그 결과 세상을 정적인 어떤 것으로 만들어야만 했던 것이다.
즉, ㉡대상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무시간적 사고’는 인간의 사고에 깊이 뿌리내린 사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생각하는 인간은 이 세상을 합리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늘 변모하는 사건들의 패턴 뒤에 숨어 있는 영원한 요소를 찾아내려고 했으며, 또한 미래에도 동일하게 그런 요소가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은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인간이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는 존재,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 G.J.휘트로, 『시간의 문화사』
'독서 > 인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로렌츠가 본, 인간의 공격성(2006, 고3, 3월) (2) | 2018.03.12 |
|---|---|
| 레비나스의 '고통'(2005, 고3, 10월) (1) | 2018.03.12 |
| 규장각(2005, 9월모평) (2) | 2018.03.12 |
| 융의 단어연상법(2005, 고3, 7월) (0) | 2018.03.12 |
| 플라톤의 이데아(2005, 고3, 3월) (4) | 2018.03.11 |
| 느낌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2004, 수능) (5) | 2018.03.11 |
| 신화의 힘(2004, 고3, 10월) (0) | 2018.03.11 |
| 역사가의 사관 형성(2004, 고3, 4월) (2) | 2018.03.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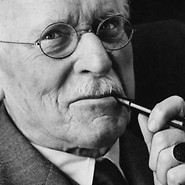



🥤댓글 .